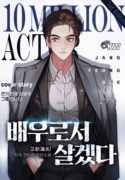A Blank Slate Regression for the Idol That Lost His Original Mindset RAW novel - Chapter (347)
초심 잃은 아이돌을 위한 회귀 백서-347화(347/476)
초심 잃은 아이돌을 위한 회귀 백서 347화
‘정이서한테 곡 써준 거, 진짜 네 의지야?’
‘야, 준아. 그럼 내가 설마 그런 놈한테 협박받아서 써 줬겠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걔가 내부 고발도 해 주고 꼴 보기 싫은 새끼들도 내 눈앞에서 치워줬으니까 이 정도야 뭐.’
‘그렇구나. 알겠어.’
회귀 전에 7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기 며칠 전, 견하준과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당시에는 레브 프로듀싱도 거부하던 내가 정이서의 솔로곡 프로듀싱을 맡았던 게 의외라서 물어본 것이라 여겼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 그 자식이 그렇게 수작 부려서 내가 뉴본을 나가게 됐던 건 모른다 쳐. 그런데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내 인생도, 네 인생도 엉망으로 꼬아 놨던 그 자식을 도와준다고 내 앞에서 흔쾌히 승낙할 수가 있냐고!”
내 손에 들어온 퍼즐 조각은 견하준의 높은 목소리와 함께 확신으로 바뀌어 비어 있던 자리에 비로소 들어갔다.
이전부터 쌓아 올린 게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저 일이 종지부를 찍은 게 맞았구나.
그때의 견하준은 지금처럼 따져 물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내게 지쳐 있었고, 지금은 과거를 틀었기에 이렇게 내게 터트릴 수 있는 거겠지.
답지 않게 감정을 날것 그대로 내보이며 숨을 씨근덕거리면서 나를 노려보는 견하준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의외로 손절이나 멀어질 사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족쇄가 한순간에 풀린 듯이 속이 시원했다.
드디어 나는 데뷔 초부터 쭉 가지고 왔던 불안감과 불신을 한결 내려놓은 채로 견하준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가 데뷔 초에 너랑 이야기하기 전까지, 네가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나한테 말해 주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나 다름없는 놈을 네가 왜 도와줘.”
원망 어린 실소를 터트린 견하준이 마른세수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치려 들었던 그 자식 얼굴을 볼 때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데, 왜 너는….”
“미안하다, 하준아. 내가 너무 무심했다. 내 잣대로만 생각하면 안 됐던 건데.”
나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낙하산으로 들어온 정이서가 아닌 우리를 뒤에서 깠던 KICKS를 견하준이 더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회귀 전후나 내가 느끼던 배신감은 오로지 정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KICKS 놈들에게 향해 있었으니.
그러니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견하준과 나는 틀림없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이 전제 자체가 오류였다.
그게 회귀 전,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고.
나는 낙하산이 꽂힌 자세한 전말을 몰랐을뿐더러, 견하준은 항상 어른스러웠고 내가 모르던 답도 척척 찾아 주었기에 낙하산 개인한테 원망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으니까.
나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윤이든으로 보아 왔던 권윤성처럼, 나 역시 견하준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견하준으로 보아 왔던 거다.
오히려 제삼자인 서예현이 먼저 견하준의 트리거가 정이서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도 같은 결이었다.
내가 간과했던 건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본인의 일이 되어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견하준이 뉴본을 나가기 전에 정이서와 만나 그에게 뻔뻔한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를 내게 굳이 꺼내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했다.
회귀 전과 달리 지금은 KICKS와 초창기부터 틀어진 상태였고, 견하준은 내가 정이서와 연락하고 지낸 걸 몰랐을 테니.
“그런데….”
점차 이성을 되찾아 가는 견하준의 얼굴을 보며 느릿하게 내뱉었다.
“너도 내가 그 자식 요구 승낙하기 전에 말이라도, 아니면 말리는 시늉이라도 해 주지 그랬냐.”
오늘 견하준의 트리거를 당긴 건 나였지만, 견하준도 내가 그 트리거를 누르기 전에 나를 제지할 기회가 있었다.
“왜 보고만 있어 놓고 네 멋대로 실망하는 건데. 말릴 수 있었잖아. 그 새끼가 네게 그랬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딴 요구를 승낙이나 했겠냐고!”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다.
견하준의 일에는 눈치가 늘어난다고 해도 서른 해가 가깝도록 남의 눈치를 본 적 없는 삶을 살아온 내가 시발, 말을 안 해 주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낙하산 씹새끼한테 호구 잡힌 이후에 견하준 너도 아닌 최현민 입으로 내가 전해 들어야 하냐고.
“나를 그렇게 못 믿겠든? 네가 저지하면 내가 그걸 네 같잖은 투정으로 받아들여서 네가 보내는 신호도 개무시하고 낙하산 새끼 요구를 승낙할 거라고 생각했어?”
드디어 이유를 알게 되어서 그런가, 회귀 전 일의 원망까지 제멋대로 섞여 들었다.
견하준의 멱살 쪽으로 뻗어졌던 손이 차마 멱살을 잡지는 못하고 허망하게 주변을 맴돌았다.
“씨발, 말 한마디만 해 주지. 그 말 한마디를 못 해 줘서 사람을 병신 만들고… 그때도 네가 말했으면 나는…”
꾹 쥐면서 밑으로 겨우 내린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회귀 전의 눈치 없었던 나도, 낙하산 그 새끼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꼬고 기만한 새끼라는 그 한마디를 못 해서 우리가 쌓아 올렸던 10년이라는 세월을 잘라 냈던 견하준도 싹 다 지긋지긋했다.
“못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믿었으니까. 당연히 너랑 내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경직된 견하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나 역시 멈칫했다.
정작 맞춰야 할 건 엇나가서 파탄이 나 놓고 왜 시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똑같고 난리냐.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었다는 걸 깨닫고 쓰게 웃었다.
“하준아. 견하준.”
내 입에서 나오는 견하준의 이름 석 자가 낯설었다. 듣는 이 역시 낯선지 눈을 두어 번 깜빡이다가 한 템포 늦게 반응했다.
“너나 나나 이제 인정하자. 예현 형 말대로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 아무리 상대를 잘 안다고 해도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법인데.”
내 슬럼프 시기 때, 나는 견하준이 내 온전한 이해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견하준은 내가 제 온전한 이해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걸 깨달았을 터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하는 이상적인 절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에는 그 이상에 너무 금이 많이 가 있었다.
“그걸 특별함으로 여기면서 서로한테 멋대로 실망하지 말고, 좀 내려놓자, 우리.”
남들처럼 대화하고, 바로바로 오해를 풀며 지내는 편이 견하준에게나 나한테나 훨씬 나았다. 나는 이미 그 특별한 관계의 결말을 보고 왔으니까.
내 말을 절교하자는 뜻으로 알아듣기라도 한 건지 견하준의 표정이 아연해졌다.
“절교하자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남들이랑 똑같아지자고…?”
“네가 정 그렇게 앞으로의 우리 사이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럼 한 대 쳐.”
툭툭, 내 볼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똑바로 견하준을 마주 보았다.
“주먹질 한 대씩 서로 주고받은 걸로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면 우리 우정이 남들과 다름없는 사이, 딱 그 정도였던 거겠지.”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될 줄은 몰랐던지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 류재희의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렸다.
“예, 예현이 형, 이제는 진짜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형들이 이제 기어이 주, 주, 주먹 다툼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냥 내버려, 아니, 말려야 하나? 어떡하지? 한 대씩만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열 대 되는 거죠, 뭐.”
“도빈아, 왜 이렇게 태평해…? 큰일 났다고 네가 제일 호들갑 떨면서 울고불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 멘탈은 악귀읍읍과의 극기 훈련과 담금질로 인해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어요.”
“도빈이 형, 헛소리하려면 좀 크게 말해 봐. 저 형들이 형 헛소리 듣고 김새서 싸움 멈추게.”
뒤쪽에서 들려오는 헛소리를 한 귀로 듣고 흘리며 여전히 멍한 얼굴로 서 있는 견하준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먼저 하고.”
퍼억-
최대한 힘을 뺀 주먹으로 견하준의 얼굴을 후려쳤음에도 불구하고 견하준은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엥, 진짜로 힘 거의 안 주고 쳤는데. 혹시 처음 맞아봐서 충격이 컸나.
견하준은 내게 무어라 따지지도 않고, 싸늘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주저앉아 있기만 했다.
시바, 진짜 괜히 손절 타이밍만 4년 당긴 거 아니야? 별 반응 없는 견하준의 모습을 보며 불안에 휩싸이던 그때.
“야, 이 미친놈아! 얼굴을 치면 어떡해! 하준아! 괜찮-”
시뻘개진 볼을 매만지며 서예현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킨 견하준이 서예현이 말릴 틈새도 없이 이를 악물고선 내게 주먹을 날렸다.
빡-
좀 치네. 터진 입가에서 배어 나오는 피를 손등으로 쓱 훔치며 피식 웃었다.
그런데 견하준 이 자식, 나는 힘 존나 빼고 쳤는데 자기는 감정 존나 실어서 쳤어.
“끄아아아! 미친놈들아!”
서예현이 경악의 비명을 내지르며 나와 견하준의 사이를 다급히 가로막았다.
맞은 놈들은 조용한데 그 장면을 보고만 있던 놈이 더 시끄러웠다.
나를 살펴야 할지 견하준을 살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서예현에게 한숨 쉬며 한마디 했다.
“형이 한 판 하라며.”
다른 친구들하고 한 것처럼 한 번 크게 싸워 보라 충고해 줬던 건 분명 서예현이었다. 본인 충고대로 따랐을 뿐인데 반응이 왜 저런담?
“내가 데시벨 높이거나 쌍욕 하랬지 언제 면상에 주먹질하랬어!”
“그거나 그거나.”
“다르지, 인마! 며칠간 스케줄이 없어서 망정이지, 이 얼굴로 스케줄 섰다고 생각해 봐. 무슨 말이 나올지!”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직 우리 이야기 안 끝났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서예현을 휙 치우고 견하준의 앞에 섰다.
분명 힘을 빼고 쳤건만 시뻘겋게 부어올라 괜한 죄책감을 안겨 주는 견하준의 볼에 시선을 두지 않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 물었다.
괜히 눈썹을 까딱이는 건 덤이었다.
“어떠냐? 얼굴 보기 싫으니까 꺼져 줘야 해?”
터진 내 입가를 빤히 보던 견하준이 평소처럼 여상하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술이나 마시러 갈래?”
“꼴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그제야 나 역시 굳혔던 표정을 풀며 씩 웃었다.
[비속어가 감지되었습니다.] [초심도 -2]흥분해서 비속어를 꽤 뱉은 거 같은데 눈치껏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로 정산해 준 시스템이 제법 감동이었다.
너 이 새끼, 이제 눈치와 융통성도 탑재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