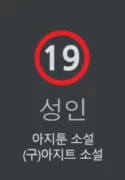Call of the Spear RAW novel - Chapter (559)
낭선기환담-558화(559/600)
낭선기환담 – 2부 268화
잔잔한 수면 위.
끝이 없는 호수 한 가운데.
구름 가득 낀 호수 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낚싯대를 던지는 자가 있었다.
빛바랜 머리칼과 새하얀 눈썹과 수염, 그리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엿보이는 노인.
겉모습만 본다면 평범한 노인이나, 풍기는 분위기는 날선 검과 같았다.
“아검.”
그는 상천해월의 역사와도 같은 지분을 지닌 아검.
검노일택이었다.
“왔는가.”
이쪽은 처다보지도 않고 그저 낚싯대를 잡고 앉아 있는다.
그저 찌를 바라본 채.
옆자리를 툭툭 두들기며 말이다.
투박한 나무 의자가 하나 비어 있어 천범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그곳에 앉았다.
“낚시는 좀 할 줄 아는가.”
“못 할 것도 없지.”
범은 검노에게 낚싯대 하나를 받아 그의 찌 근처에 던졌다.
첨벙.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천범의 찌가 일으킨 파문은 검노의 것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낚시라는 것이 참 그래.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저절로 잡히는 것은 또 아니거든.”
미끼도 달아야 하고, 근처에 떡밥도 뿌려둬야 한다.
그뿐인가.
어느 곳에 던져야 할지도 잘 정해야 하며 날씨와 시간 또한 생각을 해두어야 한다.
“그럼, 뭘 해야 잡히겠나.”
천범의 물음에 검노일택은 주름진 미소를 띠며 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잘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면,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다림의 수확을 잘 낚아채는 것.
그것이 낚시의 미학이다.
“너는 나의 하늘에 다가왔다.”
같은 물에 두 개의 찌.
수면은 푸르렇고 맑아 하늘을 그대로 비추었다.
다만, 하늘을 가리어 비추는 것은 먹먹한 구름뿐이었다.
“나의 하늘에, 나의 운명에 네가 스며들어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였다.”
하늘을 가리는 저 아득한 구름처럼.
“너는 언제나 내 앞을 막았다.”
담담히 말하는 물음에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듯 검노 특유의 무미건조한 음성이 천범의 귓가에 맴돌았다.
물론.
천범은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네 앞을 막은 건 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내 앞을 막았느냐.”
천범은 드리운 낚싯대를 치켜들어 날아오는 낚시 바늘을 잡았다.
낚시 바늘에는 미끼가 없었다.
바늘 자체도 구부러지지 않아 무언가를 낚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일자로 곧게 펴진 바늘로 대체 어느 것을 낚을 수 있을까.
범은 검노의 것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내 피식 입꼬리를 끌어 올린 그는 낚싯대를 던져놓았다.
풍덩! 소리와 함께 잔잔한 호수에 또다시 큰 파문이 일었다.
“지금은 낚싯대인거 같군.”
출렁이는 파문에 검노의 찌는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다.
“말장난을 하려는 겐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노려보는 검노의 눈빛에 천범은 함께 마주보며 서늘한 눈초리를 쏘았다.
“같잖은 낚싯대 하나로 하늘을 낚으려 하니 그런 것 아니겠나.”
“날 모독하는군.”
스릉!
들고 있던 낚싯대는 어느새 날카로운 검으로 변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날 선 검이 천범의 목에 겨누어진다.
허나 범은 눈 하나 깜빡 않았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인 줄은 아느냐.”
“내가 원하는 바는 오래토록 오직 하나. 천검뿐이다.”
허나 범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아검, 자네는 어찌 천검을 쥐고 있지 않는 것인가.”
“….”
천범은 자신의 목에 겨누어진 검을 손가락으로 쳤다.
퉁- 투명하고 맑은 소리가 호숫가의 파문과 함께 퍼져나갔다.
“내가 자네의 앞을 막은 것이 아냐. 자네의 앞을 막은 것은 하늘이지 내가 아니야.”
“우습군, 자기 자신을 하늘이라 칭하는 것인가.”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허나 중요한 건 자네는 뚫어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나.”
그러자 검노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네놈은 하늘을 뚫을 수 있다는 말이던가.”
그의 물음에 천범은 뒷짐을 지고 등을 돌렸다.
한 걸음, 두 걸음을 거닐고 슬쩍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아검. 자네의 도는 무엇인가.”
그의 물음에 검노일택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호수를 보았다.
그러자 여러 파문이 동시에 일었고, 각기 다른 검이 그 위로 나타났다.
수천 개의 검이 빼곡하게 나타나 답을 대신했다.
그에게 도(道)라 함은 곧, 검이다.
검이 도이고, 도가 검이다.
척.
검노일택은 검 하나를 잡아 매만지며 위아래로 훑었다.
“나의 도는 줄곧, 검이었다. 그 어떤 길이라도 검으로 베어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베고, 또 벨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전부 베어버릴 것이다. 너는 물론이요,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 모조리 벨 것이야.”
너의 땅.
너의 하늘.
너의 도.
“너의 이름까지 그 전부를.”
베어버리는 것이.
“나의 도이다.”
* * *
고철 덩어리를 한데 뭉쳐 놓은 듯 얼기설기 얽혀있는 검노의 칼날.
마치 가시덤불 같은 그 칼날의 한가운데에 피 흘리며 꽂혀져 있는 천범의 모습은 어딘가 신성하기도, 비극적이기도 하였다.
“설마 이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장난인지… 예정된 운명인 건지… 알 길은 없네요.”
절마대군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눈빛으로 대신하여 말하며 검으로 된 가시덤불 속 천범을 보았다.
본래라면 검노가 변한 칼날이 천범을 도륙했어야 할 터.
허나 점멸하는 금색의 빛은 아직 죽지 아니했으니, 그의 육신은 아직 형형하다.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럴 것이다.
“허나 그를 죽인다 한들, 출구는 있지 아니한데… 내가 살 길은 어디엔가 있으려나.”
끼기긱.
주르륵.
칼날이 그를 더 강하게 조인다.
피가 날을 타고 흐른다.
붉은 피는 잠시 금빛을 반짝이다 명멸한다.
“그래도 한쪽에 걸어야 한다면….”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운다.
그늘진 검노의 칼날의 덤불이 칠흑처럼 검게 변한다.
점점 증식하는 칼날의 향연 속에서도 금색의 빛은 사라지지 아니하니.
“반짝이는 쪽에 걸어야겠지.”
위태로운 한줌 빛이라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러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
* * *
“나의 도는 이러하다. 하면 이제는 내 차례로군. 너의 도는 무엇이냐.”
검노의 물음에 천범은 담담히 그를 응시했다.
“나의 도라….”
도란 무엇일까.
어떤 이에게는 그저 목의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약속한 여인일 수도 있다.
다른 이는 목숨보다 중요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
시작은 수단이었다.
그에게 도라는 것은 역경이었고, 시련이었으며 비극이었다.
허나 그 사이에 희노애락 또한 끼어 있으니 이제는 수단이지 않다.
도(道).
그것은 지키는 힘.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수단.
‘허나….’
그것이 이제는 삶.
그의 삶 그 자체이니.
그에게 도란….
“벽이었다.”
“벽? 네게는 그것이 벽이었나?”
검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얼마나 대단한 소릴 하려고 자신에게 물었나 싶었다.
한데 고작 벽이라니.
벽이라니!!
가장 드높은 상천해월의 원선부터 시작하여, 가장 미천한 하계의 검선까지 모르는 이가 없는 당연한 것.
어린아이조차 아는 그것을 저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던 검노일택은 이내 웃음기가 싹 가셨다.
“검을 쥐어라.”
호수 위.
수많은 검들 중 하나를 쥐라고.
“쥐어서 베어보라. 나는 날 베었다. 나약한 연모지정을 베었다. 그리고 나를 베었다. 하여 너도 벨 것이다.”
베고 베어 하늘도 벨 나의 검이니.
쥐어서 베어보라.
“너의 검이 대체 무엇을 벨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베지 못하면.
거꾸로 네가 베어질 것이니.
“그러니 검을 쥐어라.”
이곳에 자리한 수천, 수만 자루의 검들은 모두 자신만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허나 범은 눈 여겨 보지 않았다.
“왜, 너의 검이 없는가? 아니면 혹, 이것을 찾는가?”
스르륵.
검노의 손에 화란의 모습을 한 검 또한 나타났다.
하지만 천범은 눈길 주지 않았다.
“내게 도라는 것은 언제나 막다른 길이었으며 단단한 벽이었다. 언젠가는 길을 잃고 오래토록 헤맸고, 또 언젠가는 단단한 벽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
검노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의 말에 담긴 뜻 때문이기도 했으나, 모습이 빛나기도 해서였다.
‘금빛 물결이….’
어느새 푸르렇던 호수의 물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위에 자리한 수만 개의 검들이 빛을 반사시켜 반짝거리며 흔들렸다.
“허나 그럼에도 나는 나아갔다. 그래, 내게 도는, 벽이었다.”
더욱 빛나는 천범의 모습.
검노는 악을 쓰듯 외쳤다.
“너 또한 그 벽을 베고 싶겠지!! 그럼 베어라! 이곳에 자리한 수많은 검들 중 하나의 검으로!!”
너도 나처럼.
검을 들고 눈 앞의 것을 베어라.
베고 베다, 자신까지 베어라.
허나 검노의 의도와는 달리.
천범은 고개를 저었다.
“나의 벽은 하늘이다.”
이전에는 그것을 베어내고자 했을 것이다.
나아가기 위해 그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덜어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조차 떼어내고,
자신을 찾는 친우조차 떼어내고,
오로지 벽을 부수고자 했을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러했다.
이제까지 그의 도는 수단.
지키고픈 것을 지키기 위한 역경.
헤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도는 목표기도 했다.
그 목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지키고픈 것을 외면하고.
품고자 하는 것을 덜어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갔던 것인가.
“허나 이제는 아니다.”
후우웅!!
화아아아아아아악!!
호수 위의 파문이 거칠게 요동쳤다.
검들은 모두 쓰러졌고, 불기둥이 치솟아 먹구름 진 하늘이 꿰뚫렸다.
“하늘이….”
구름이 개어 맑은 하늘이 나타났다.
금색으로 반짝이는 천범의 주위로 모든 것이 물들어 간다.
금천(金天).
“나에게 대도(大道)는 자신이다.”
나의 불은 하늘을 밝히고.
나의 의지는 하늘을 물들이니.
내가 곧, 하늘.
금천이다.
“검을 찾다, 스스로 검이 되어버린 자, 검노일택이여. 네가 찾아 헤매며 바라던 검은 결국 자신이었구나.”
베고, 베어 결국에는 자신만이 남은 검.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택한 검.
“허나 하늘에는 닿지 못한 검.”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비아냥거리는 물음에 천범은 당연하다는 듯 되물었다.
“네 검은, 한 번도 진정으로 하늘을 향한 적이 없었지 않은가.”
“……!”
그의 답에 아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그래, 그랬던 건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보이다가도, 이내 고개를 휘저었다.
“아니.”
하여 다시금 천범을 바라보곤 날카롭게 눈을 떴다.
“나는 벨 것이다. 네가 무엇이 된다 한들, 내게 남은 것은 베는 것뿐.”
무엇이든, 벨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없기에.
“내게 남은 것은 베는 것뿐.”
그와 동시에 호수 위에 다시 금빛이 아닌 시린 검광이 번뜩인다.
마치 금빛을 밀어내려 하듯.
푸르고 시리도록.
그 광경을 보며 범은 담담히 말했다.
“그리해라. 허나 네가 베어야 할 것은 하늘이다. 나는 상천(上天)이 될 것이다.”
내게 스며든 하천의 힘이.
그리 하게 할 것이다.
하여 금색으로 물든 하늘 아래.
“네 서 있을 자리 두지 않을 테니.”
사라져라.
“명멸(明滅).”
나의 하늘 아래.
너의 빛을 지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