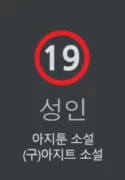Catch the ghost munchkin! RAW novel - Chapter 105
105화
한아름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23조원들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그러자 온주환이 한아름의 귀에 뭐라 작게 속삭이더니 둘이서 민박집을 빠져나갔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 오늘 저녁은 아주 특별한 음식을 대령하겠습니다.”
덕팔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밝고 크게 말을 하자 노은지가 주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오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뭐 먹어요?”
“1등급 한우 갈비보다 더 맛있는 돼지등갈비 김치찜!! 저의 숨겨진 한 수! 오늘 개봉합니다. 하하”
23조원들이 환호를 하였다. 한우 갈비는 이미 물 건너간 것!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만약 덕팔이 미리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23조원들은 약초 몇 개를 찾는 것으로 게임을 끝냈을 것이었다.
오늘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덕팔의 덕이었으니 덕팔 때문에 한우갈비를 먹지 못한다고 한들 크게 아쉬울 것이 없었다. 게다가 심사도 석연치 않았으니 덕팔에게 잘못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때에는 깨끗하게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었다.
**
“뭐? 진짜?”
“네, 누나!”
“말도 안 돼, 고등학교 동기면 동기였지 그렇다고 친구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저 형, 3월 달부터 민 교수님한테 들들 볶였어요. 이번에 법대로 재입학했다가 다시 편입하게 된 것도 민 교수님이 통합의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이래요.”
“정말? 자칫 했으면 수석으로 입학하고도 짤릴뻔 한 거네?”
“내 말이요.”
“민 교수님은 선배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래?”
온주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게 속삭였다.
“민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덕팔이 형한테 완전 밀렸대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만나니까 불안했나 봐요.”
“이야.. 덕팔 선배가 엄청나긴 했나 보구나.”
“그럼 뭐해요. 김정학 교수님 안 계셨으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짤리게 생겼는데…”
“근데 너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거야?”
온주환이 다시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더 작은 목소리로 한아름의 귀에 속삭였다.
“뭐? 정말? 최 교수님하고? 말도.. 안 돼!”
“누나만 알고 있어야 해요? 절대 비밀! 알죠?”
한아름이 고개를 끄덕이자 온주환이 웃었다.
“근데 진짜 놀랍지 않아요?”
“뭐가?”
“생각해봐요. 겨우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남자를 위해서 한국대 교수가 뒷바라지한 거잖아요.”
“어머,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키워서 잡아먹은 거잖아? 나도 머리 좋고 잘생긴 중학생 알아봐야 하나? 호호”
한아름이 분한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농을 하자 온주환이 크게 웃었다.
“가요. 누나! 덕팔이 형이 엄청 맛있는 저녁 해 준다고 했어요. 소갈비 따위 잊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돼지갈비를!!”
온주환이 웃으며 한아름과 함께 나란히 민박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
덕팔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22조 이민성은 덕팔이 23조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즉시 식재료로 받은 돼지 등갈비와 묵은지를 들고 덕팔을 찾아왔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민성이 음식 재료가 담긴 비닐봉투를 앞으로 쭈욱 내밀며 허리를 숙이자 덕팔이 이를 받아들며 웃었다.
“함께 해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제가 후밴데 당연히 편하게 부르셔야죠. 은성이라고 불러주세요. 말도 편하게 해주시구요. 아름이하고 나름 친합니다.”
“그래? 그럼 잘 부탁해. 내가 아직 아름이하고 덜 친해서 말이야. 하하”
두 남자가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이민성은 유쾌한 남자였다. 지금껏 덕팔이 듣지 못했던 학교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리고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진짜? 난 전혀 몰랐네.”
“형이야 아직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사실 저도 친한 4학년 형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실습 나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대요. 정교수님들이 학교에서는 호랑이여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요. 병원은 부교수님들의 철옹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친한 형이 저보고 2학년 때부터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며 인사를 하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양의학과는 안 그렇지?”
“글죠. 거기는 병원에서 정점에 올라야 학교에서 정교수를 하니까요. 아무래 우리 과가 신설 학과라서 비정상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형….”
이민성이 덕팔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작게 소리를 죽여 입을 열었다.
“민 교수님이 좀 치사하게 굴어도 그러려니 하세요. 2학년만 되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고맙네? 하하”
“다 밥값이죠. 하하하”
이민성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넉넉하게 40인분의 밥을 해 놓은 덕팔과 이민성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밥솥에 밥을 옮겨 담은 후, 누룽지를 긁었다.
“형, 이 누룽지 나눠 주실 거죠?”
“나눠 주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지만 나 같으면 저녁 야참을 위해서 좀 참겠다.”
“야참요?”
“우리 벌칙 받으러 가야 하잖아. 끝나고 나면 술도 한잔할 거 같은데 그 전에 속을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
“누룽지로요?”
“간단하게 누룽지탕만 끓여도 요기는 되니까”
“오호..”
이민성이 눈을 반짝이며 솥에서 작은 누룽지 조각을 뜯어 입에 넣고는 히쭉 웃었다.
“나머지는 킵입니다. 하하”
누룽지가 덕팔과 이민성만 아는 은처로 옮겨진 후, 무쇠솥은 새로운 물을 받아들였다. 물이 끓자 소주를 섞은 찬물에 담가 두어 핏기를 제거한 돼지 등갈비를 가지고 왔다.
“우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김치 익는 냄새만으로 코가 떨어지네요. 형!”
“맛있겠지?”
이민성이 돼지 등갈비를 바닥에 깔린 김치 위에 잘 올려놓자 덕팔이 미리 준비한 양념을 풀고 통감자와 굵게 쓴 대파를 넣은 후 솥뚜껑을 닫았다.
“민성아, 여기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이장님께 다녀올게.”
“거긴 왜요?”
“아까 눈치를 보니까 이 마을 이장님 댁이 보물창고 같아서 말이지. 하하하”
덕팔이 민박집 대문을 나설 때, 긴한 대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온주환, 한아름과 마주쳤다.
“선배, 어디 가요?”
“이장님 댁에 가서 필요한 재료 몇 가지 구해볼까 해서..”
덕팔이 한아름을 지나쳐 집 밖으로 벗어나려 하자 그런 덕팔을 한아름이 잡았다.
“선배, 후배들 있잖아요. 새파란 후배 9명이 방구석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서른 넘은 선배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응? 아니 내가 가야 제대로…”
“선배는 쟤들이 바보로 보여요? 심부름 정도는 시키면 다 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선배가 자꾸 그러니까… 애휴, 아니에요. 일단 들어와요. 할 얘기도 좀 있고..”
한아름이 덕팔의 팔을 잡곤 무작정 끌고 23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한아름의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무쇠솥을 지키고 있던 이민성이 23조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여 방문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지만, 한아름의 큰소리 뒤에는 워낙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길지 않는 대화가 오간 뒤 23조 조원들이 한결 편안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방 밖으로 나온 덕팔의 얼굴이 어색하게 변해있었다.
“하아.. 이거 참!”
“괜찮아요. 형! 교수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참!”
**
마지막으로 들깨가루가 투하된 후, 다시 솥뚜껑이 닫혔다. 22조와 23조가 공동으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덕팔은 그 사이 나물 몇 가지로 밑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오빠, 이 시금치 무침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제 입맛을 이렇게 올려놔요? 책임져요.”
22조 조원의 항의 아닌 항의에 덕팔이 웃었다. 널찍한 대접에 담긴 등갈비 김치찜이 남학생들에 의해 배달이 되자 방에 빙 둘러앉은 24명의 학생이 식사를 시작했다.
“와.. 끝내준다.”
“식당에서 파는 건 비교도 안 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식감도 죽이고…”
“야야, 김치가 예술이다. 나 이거만 있으면 밥 10공기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각자 나름의 평가를 쏟아내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조원들을 바라보며 덕팔이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형, 저 왔어요.”
조인범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정학 교수가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 오장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네.”
조인범이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는 김정학 교수를 꼬셔 23조로 온 모양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점심도 잘 못 드셨다고 하셔서 드실 음식을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그래? 이 늙은 선생을 알아주는 이는 늙은 학생뿐이군. 동병상련인가? 허허.”
김정학 교수의 농담에 학생들이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학생들이 상을 펴주려고 하였으나 김정학 교수가 체면 따위는 있고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밥그릇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허어.. 맛있군, 속이 뒤집어져 입맛을 잃었는데 이 찜 앞에서는 뒤집어진 속도 무용지물이군. 허허”
공기밥 두 그릇을 비워낸 김정학 교수가 맨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22조, 23조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오직 김정학 교수와 덕팔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정학 교수와 식사하니 자리가 불편했던 학생들이 불이 나게 식사를 마치고 방을 비운 것이었다.
덕팔은 김정학 교수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사 시간을 조절하며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승과 오랜 세월 생활하며 배운 예절이었다.
“차를 가져왔나?”
“낮에 산에서 좋은 칡을 캤습니다.”
“아.. 그 칡?”
“네”
“차로 마시려면 건조를 해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건조를 해 놓았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좋은 대추도 구했고, 또… 산에서 몇 가지 약초도 구해서 함께 우려 볼까 싶습니다.”
“그래? 좋지, 좋아. 허허허”
덕팔이 그릇을 정리하고 작은 상을 펴 김정학 교수 앞에 내려놓았다. 식사야 워낙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바닥에 음식을 내려놓고 먹게 되었지만, 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잠시 후, 덕팔이 사기대접에 가득 담긴 거무튀튀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김정학 교수가 이를 받아 한 모금 마셔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은은하게 칡 냄새도 나고, 생강에, 대추향도 나는 것이 아주 맛이 좋긴 한데… 이 청량한 뒷맛은 뭐지?”
“사략초입니다.”
“사략초? 사략초에서 이런 맛이 나? 아니, 그보다 제독을 어떻게 했나? 할 줄 모른다더니?”
“물고 늘어질 준비가 되신 분께는 빨리 물리는 게 좋죠. 안 물리려고 발버둥을 치면 팔 하나 잃을 일로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허허..”
김정학 교수가 끄윽 하며 트림을 했다.
“미안하네. 답답했던 속이 이제야 풀려서 말이야. 허허”
김정학 교수가 다시 차향을 음미하며 한 모금 들이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