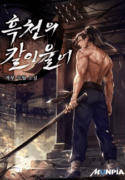Dogummuan RAW novel - Chapter 83
83
[도검무안 83화]
第十三章 진공(眞功) (6)
마록타는 말을 해주려고 입을 달싹거렸지만 하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치민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귀영홀류, 귀영홀류다.
단 네 마디만 말해주면 된다.
이들은 귀영홀류라는 신법을 알지 못한다. 생전 처음 들은 무공 명칭일 게다.
그래도 말해주면 안 된다.
마록타의 무공에는 비밀이 있다. 그의 무공에는 염왕이 제 길을 가지 않을 때, 생명을 끊어야 하는 임무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
알다시피 염왕의 무공은 계속 발전한다. 하루가 다르게 정상을 향해 치솟는다. 마록타와 비교했을 때 지금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는 갈수록 벌어진다.
그래서 마록타의 무공이 더욱 은밀하게 감춰져야 한다.
누구든 그의 무공을 알게 되면, 반드시 연구라는 걸 하게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소한 무공, 강한 무공을 보면 반드시 파해법을 생각하는 게 무인들의 생리다.
이들은 귀영홀류라는 신법을 찾을 게다.
어쩌면 염왕이라는 대목에서 시종의 무공까지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파해법이 흘러나오면…… 그것을 자신이 알게 되면…… 마록타는 자신을 죽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의 무공은 철저하게 비밀스러워야 한다.
야뇌슬이 말했다.
“주인은 시종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허!”
야뇌슬의 말에 취화선개가 혀를 찼다.
“쯧! 시종 놈은 주인 이야기 하지 않고, 주인 놈은 시종 이야기 하지 않고. 잘하는 짓들이다. 쯧!”
단황신개가 못마땅해서 혀를 찼다.
“웬만하면 말해주지 그래?”
모용아가 말했다.
그녀 생각에도 이런 정도는 굳이 비밀이랄 것이 없어보였다.
적암도의 무공이 워낙 비밀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칭 좀 묻는데 말해주지 않을 건 없지 않은가.
“시종의 무공에는 사연이 있어서……”
야뇌슬이 말끝을 흐렸다.
점심 요기도 할 겸, 잠시 휴식을 가졌다.
마록타가 다가와 말했다.
“고맙다. 말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건 말로 하지 말고 다리라도 주무르던가. 뭔가 다른 걸로 보상해.”
“이놈, 갈수록 느물거려.”
“하하하!”
“웃지 마라. 너 죽일 때 손 끝 떨린다. 그러면 너만 더 아파.”
“그건 네 문제지. 날 고통스럽게 보내면 그 마음인들 편할까. 그러니 손 쓸 때 잘 써.”
“키키키! 그건 걱정마라.”
마록타가 다시 삼십 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두 사람이 뭐 별로 숨길 것도 없는 이야기라는 듯 태연히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노화자들 그리고 두 여인,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 내쉬었다.
“후우!”
“휘우!”
각기 다른 한숨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도대체 이놈들…… 무슨 관계지? 말 잘 듣는 시종이, 야뇌슬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던질 것 같은 마록타가 뭐? 야뇌슬을 죽여? 손끝이 어쩌고 어째?
두 사람의 무공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신법은 마록타가 탁월한 것 같지만, 그건 야뇌슬의 신법을 보지 않아서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나 마록타는 야뇌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마록타가 야뇌슬의 목숨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더 이상 생각을 말자. 골치만 아프다. 이놈들에 대해서 알려면 두통께나 앓아야 할 게다.
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건포를 씹어 먹었다.
***
“대화금장 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간은 있어. 필요하면 모용세가(慕容世家)로 찾아와.”
모용아가 미안해서 말했다.
결국 야뇌슬을 이용만 했다.
그가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나름대로 어떤 목적도 있었다. 순수하게 독고금의 탈출만 노리고 도련을 파고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안하다.
“아니…… 그건 구체화된 생각이 아냐. 돈이 준비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될 줄 알았고. 하하! 그래도 장주의 목숨이라면 꿈쩍은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네. 상가(商家)의 핏줄이 냉정하다는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하하하!”
야뇌슬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그 일 때문에 서먹서먹 했는데, 정작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어떤가? 그 성 하나를 살만한 돈이라는 게 결국 도련을 상대할 목적인 것 같은데, 계획만 타당하다면 십시일반(十匙一飯)해도 될 것 같은데.”
야뇌슬은 고개를 저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쯧! 같이 가면 좋으련만……”
취화선개가 영 아쉬운 듯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야뇌슬은 모용아의 손목을 잡았다.
모용아는 흠칫 하면서 손을 빼려다가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손목을……’
사내가 그녀의 손목을 잡은 건 야뇌슬이 처음이다.
무슨 생각으로 손목을 잡은 것일까? 설마 좋아한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가?
야뇌슬이 그녀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며 말했다.
“저 여자…… 노련한 면에서 너보다 낫다.”
독고금을 보며 한 말이다.
그 말에 독고금도 그를 쳐다봤다. 그가 모용아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도 봤다.
“뭐야? 그런 말은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지.”
모용아가 입을 삐죽 내밀며 기분 나쁜 듯이 말했다.
누가 기분 좋겠는가. 난생 처음 손목을 잡은 사내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난 상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여자를 보니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람을 만나겠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흥정할 거야.”
“손이나 놓고 말해. 왜 남의 손은 잡고 그래!”
“사람을 보는 눈, 일을 처리하는 결단력…… 이런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넌 신산여제갈이라며?”
“……?”
“하하! 련주에게도 아주 뛰어난 지자가 있었지. 그 자의 이름은 빈산릉. 저쪽 강 너머에는 추여룡이라는 자가 뛰어난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빈산릉이 뛰어나. 그런데 그런 자가 우리 탈출을 막지 못했어. 왜 그런지 알아?”
“……”
모용아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다. 야뇌슬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 게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 큰 그릇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간장을 담을 때는 간장종지를 써야 한다.
빈산릉은 장계(長計)를 자는데 능통하다. 반면에 싸움판에서 즉각적으로 머리를 짜내야 하는 전투 머리는 없다.
장계를 계획하는 머리고 싸움 판도를 짰으니 실패한 게다.
야뇌슬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장계용이다. 반면에 독고금은 실전용이다.
“칫! 알아들었군.”
야뇌슬이 모용아의 손목을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용아가 야뇌슬을 손목을 잡았다. 모용가의 금나술(擒拿術)을 써서 뱀이 장대를 휘감듯, 손목을 말아감았다.
“이론으로는 나, 현실로는 독고금. 맞지?”
“맞아.”
“손목은 왜 잡았어?”
“끝까지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왜?”
“……”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면 질투할 것 같아서?”
“잘 알면서 묻는 건 뭐야?”
“좋아. 그건 잘했어. 손목을 잡지 않았으면 질투 나서 그냥 돌아섰을 거야. 날 불러놓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 장점을 이야기 하는 건 정말 듣기 힘들거든. 그런데……”
“그런데?”
“나 남자에게 손목 잡힌 거 처음이야.”
이번 말은 거의 귓속말에 가까웠다.
순간, 야뇌슬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다.
“나, 난 그런 뜻이……”
그가 말까지 더듬거렸다.
“생각 좀 해보고 네가 쓸 만한 남자 같으면 쫓아다닐 생각인데, 괜찮겠어?”
여전히 속삭이는 음성이다. 아주 작게 말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다.
그도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그, 그게…… 난 싸워야 하고……”
“싫어, 좋아. 짧게 말해. 구차한 건 싫어.”
“훗!”
야뇌슬이 피식 웃어버렸다.
여자는 얼굴이 열두 개다. 아침에 보는 얼굴이 다르고, 저녁에 보는 얼굴이 다르다. 누나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많은 얼굴을 지니고 있는지 감탄했었다.
모용아가 그런 얼굴을 가졌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이 다르다. 순진한 면과 당돌한 면을 동시에 지녔다.
“그 웃음, 좋다고 받아들여도 돼?”
“좋아.”
“좋아? 방금 좋다고 했다?”
“좋아. 생각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쫓아와.”
야뇌슬은 모용아가 싫지 않았다.
여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자다.
그녀는 모용가문의 여식이다. 상관없다. 모용가문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신산여제갈이다. 그런 것도 상관없다. 오로지 그녀만을 봤다.
괜찮은 여자다.
모용아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활짝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