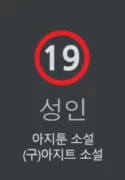Granddaughter of the Namgung family's return RAW novel - Chapter (94)_1
남궁세가 손녀딸의 귀환-94화(94/319)
“신기하네? 같은 여자애라 그런가? 나쁘지 않은데?”
“야, 얘도 데리고 가자. 본채 도착해서 청소조나 세답조에 던져 주면 되잖아?”
“하긴 그쪽도 일손이 부족한 모양이었지.”
저들끼리 대화를 나눈 수적들이 결론을 내리고 설화를 향해 말했다.
“야, 너. 넌 오늘부터 이 배의 막내다. 네가 할 일은 이놈이 알려줄 거고. 특히,”
두건 수적이 화린을 가리켰다.
화린이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거기, 걔. 안 울게 해라. 이 배에서 애 울음소리 났다간 곧바로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네.”
수적들은 낄낄거리며 다시 창고를 벗어났다.
창고의 문이 쾅- 닫히는 것과 동시에 유강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너 대체 무슨 생각….”
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설화의 관심은 온통 화린에게 쏠려 있었다.
설화는 화린의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덤덤하게 말했다.
“들었지? 네가 울면 난 그 길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야.”
곁에 있던 유강의 입이 쩍, 벌어졌다.
“가뜩이나 겁먹은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가 후다닥 달려와 설화와 화린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곤 섬세하고 세심한 손길로 화린의 구겨진 옷을 정리해 주고, 아이의 그렁그렁한 눈물과 콧물도 손수 닦아주었다.
“아이구, 착하다-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앗! 이것 봐라? 이게 언제 여기 붙었지! 이런 나쁜 지푸라기!”
금세 울먹일 것 같던 화린은 유강의 장난에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었다.
익숙하게 아이를 달래는 모습에 설화의 표정이 묘해졌다.
만난 지 불과 반 시진이 안 되었는데도 유강과 화린은 어느새 둘도 없는 남매지간처럼 보였다.
‘쟤도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없겠네.’
납치되어 온 것을 잊은 건지, 꺄르르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를 보며 설화는 기둥에 등을 기대앉았다.
“?”
주머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꺼내 보니 화린의 생일선물로 주려 했던 머리장식이었다.
장식을 잠시 내려다보던 설화는 유강과 놀고 있는 화린에게 다가갔다.
“…?”
화린이 설화를 올려다보았다. 화린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런 화린의 앞에 설화가 앉았다.
그러곤 제 손에 무언가를 꼭 쥐여 주었다. 귀여운 토끼 모양 머리장식이었다.
“원래는 네 생일에 주려고 했던 건데.”
화린이 동그란 눈을 깜박였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집에 돌아가면 머리장식에 어울리는 옷을 사자.”
설화는 싱긋 웃으며 화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겁먹지 않게. 무섭지 않게. 울지 않게.’
“착하네.”
혹시라도 유강에게 한 소리 듣진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유강은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다행이야.’
설화는 부담스러울 만큼 초롱초롱한 화린의 눈빛에 조금 머쓱해졌다.
무어라 말하고 싶은 듯 화린의 입술이 자꾸만 달싹였다.
“언니라고는 불러도 돼.”
화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화색이 되었다. 그러다 설화를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 언니.”
화린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가느다랬다.
“나 언니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작고 작은 아이여서 설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곁에서 무어라 하는 유강이 보였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입 모양과 행동으로 하는 말에 설화는 어색하게 화린을 토닥여 주었다.
이전 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이의 품은 따뜻하고 간지러웠다.
‘무슨 수를 쓰든….’
화린이를 지켜야 해.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혹여 자신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작은 아이를 토닥여 주며 설화는 다짐했다.
* * *
화린이 잠든 밤.
설화와 유강은 갑판으로 나왔다.
선실 쪽에선 술판이 벌어진 것인지 와하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수적들이 배를 정비하고 있었다.
유강을 따라 갑판의 물건들을 닦으며 설화는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호로 이어지는 강줄기에서 출발한 배는 남쪽, 장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남궁이라도 수적의 배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겠지.’
남궁이 아무리 빠르고 튼튼한 배를 가졌다 해도 물에선 수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애초에 물에서 사는 이들이고 그것을 강점으로 힘을 길러온 이들이니 당연한 것이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이상, 배를 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육지였다면 추적에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물길로 가는 바람에 그보다 몇 곱절은 걸릴 터였다.
아니, 추적로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인 상황이었다.
설화가 주머니에서 철탄 하나를 꺼내 기를 실은 뒤 손가락으로 튕겨냈다.
철탄은 빠르게 날아가 먼 물가에 드리운 나뭇가지를 부러트리고 부러진 틈새에 박혔다.
지금으로선 그녀가 유일하게 흔적을 남길 방법이었다.
‘알아봐야 할 텐데.’
“막내야.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떡해? 여길 이렇게 닦으라니까?”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유강이 설화의 앞쪽 난간을 손걸레로 박박 닦았다.
조금 전부터 말로는 타박하고 있으면서 괜히 설화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였다.
창고에서도 화린이 잠들 때까지 조잘조잘 아이의 기분을 맞춰 주더니, 이제는 자신의 기분까지 챙겨주려는 모양이었다.
설화는 대답 대신 그가 들고 있는 손걸레를 빼앗아 배의 난간을 닦았다.
유강이 ‘어어….’하며 당황하길 잠시, 어딘가에서 봉걸레를 가져와 그녀의 주위 바닥을 닦았다.
– 본채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쳐.
설화의 전음이 유강의 머릿속을 울렸다.
슥, 슥, 움직이던 봉걸레가 우뚝, 멈췄다. 그러다 이내 싱글싱글 웃으며 다시 걸레를 움직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