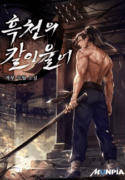Hunter and the Mad Scientist RAW novel - Chapter 40
40화
시더가 빗속으로 나가서 말들을 나무에 묶어 두는 동안, 에스페란사는 그나마 비가 덜 떨어지는 그늘에서 4인용 피크닉 돗자리를 파이프에 밧줄로 꽉꽉 묶었다. 그리고 돗자리 크기보다 조금 작은 합판을 펼쳐서 젖은 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 돗자리 한 장을 깔았다. 그리고 왠지 썩 못 미더운 네 개의 파이프를 바라보았다.
“이게 설까?”
“가망 없어 보이네요.”
혼잣말이었는데 등 뒤에서 대답이 들렸다. 에스페란사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럼 돗자리라도 뒤집어쓰고 있죠 뭐.”
그때 가선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다 있는 요술램프 같은 인벤토리 안에, 하필 우산 하나 없다니! 필요한 것만 없는 것이 정말 인벤토리답다. 에스페란사는 상태 창을 노려보며 합판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각각 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합판 옆의 땅에 꽂았다. 파이프가 위태롭게 흔들리자, 에스페란사는 미친 척 파이프를 높이 들어다 땅 깊숙이 꽂아 넣었다. 3분의 1 정도가 푹 박히자, 사람 키만 한 파이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더가 혀를 차며 나머지 파이프들을 비슷한 깊이로 박아 넣었다. 에스페란사가 또 ‘이걸 하네?’ 하는 눈으로 쳐다보자 눈썹을 치켜들었다.
“날 무슨 유리 인형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로 곱게 보진 않았어요.”
에스페란사가 재빨리 반박했다. 시더는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맘대로 해요, 맘대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진 높이였지만, 바람이라도 불면 옆으로 비가 쏟아져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위라도 가려 두니 살 만했다. 널찍한 합판 위에 겨우 두 사람 앉을 자리가 마련됐을 뿐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꼴이람? 한숨 돌리고 나니 웃음이 터졌다. 마주 보고 웃다가, 이 꼴을 하고도 웃는 게 더 우스워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너무 젖어서 무겁기까지 한 겉옷을 벗으니 좀 살 것 같았다. 에스페란사는 인벤토리를 다시 뒤져 보았으나, 수건도 찾을 수 없었다. 에스페란사가 가진 천이라고는, 누가 봐도 저런 걸론 물이 절대 안 닦인다 싶은 장비 정도가 전부였다.
“이거 써요.”
시더가 모서리가 각지게 접힌 손수건을 내밀었다.
“아, 고마워요.”
젖은 뺨과 목덜미를 닦아 내고 돌려주자, 시더 역시 덜 젖은 면으로 대강 얼굴과 손만 닦았다. 그리고 에스페란사를 흘끔 보더니, 손수건의 마른 부분으로 물기가 남은 턱을 닦아 주었다. 얇은 손수건 사이로 차갑게 식은 손끝이 느껴졌다.
숨을 내쉬는 조용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빗소리가 귀가 먹먹하도록 젖어 들었다. 에스페란사는 젖은 치맛자락을 모았다.
한 번 떨어진 체온은 잘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은 합판을 깨고, 시더가 그 와중에도 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정말,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처음 해 봐요?”
“이런 거 처음 해 보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더가 되물었다. 에스페란사는 머리꼭지부터 턱 선까지 귀족이라고 적혀 있는 듯한 얼굴을 훑어보면서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런 거 처음 해 보게 생긴’ 얼굴치고 그의 손에는 굳은살이 여기저기 박여 있었고, 손재주가 좋은 탓인지 요령이 없을 뿐 처음 하는 일도 제법 잘 해냈다.
“이러다 어두워지면 어떡하죠?”
“체온이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나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숲에 사는 들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도적들은 괜찮고 들짐승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다.
“뭐 그렇다기보단.”
에스페란사가 말을 얼버무렸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늑대 떼 정도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들짐승 하니 말인데,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에스페란사가 쉿, 하고 속삭였다.
“이상한 소리? 안 들리는데요.”
“아. 가만있어 봐요.”
시더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에스페란사는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커다랗게 뜨인 회색 눈이 입술을 막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민망해진 에스페란사는 눈을 굴리며 손을 슬쩍 내려놓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손이 얌전히 무릎을 끌어안자, 시더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다.
대화가 끊기자,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 같은 것이 들렸다. 끊어질 듯한 신음 소리. 시더가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근처에 다친 동물이라도 있는 걸까요?”
“방금까진 들짐승이 나타날까 걱정된다더니, 알고 보니 당신한테 맞을 짐승 쪽을 걱정한 건가요?”
이것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눈앞에 다친 짐승이 있으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은가? 맹수라면 좀 꺼려질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은 맹수에게 다치겠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걱정 좀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시더가 픽 웃으며 물었다. 고작 그 웃음에 자기 무기로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 나쁜 타격감이 느껴졌다. 에스페란사는 입을 삐죽이며 무릎을 더 세워 안았다.
“아니면 말고요.”
“에스페란사, 내 장비 좀 꺼내 줘요.”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는 곳에서 금속 장비를 만지겠다고?
“왜요?”
“궁금하다면서요?”
시더는 소매 단추를 풀어 접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할 일도 없었으므로, 에스페란사는 장비를 꺼내 주며, 겸사겸사 피크닉 바구니도 꺼냈다.
모닥불과 피크닉 바구니. 쫄딱 젖어서 돗자리로 비를 피하고 있는 상황만 아니었다면 꽤나 낭만적인 조합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얼토당토않은 마도 공학 연구 장비들까지.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람.
인벤토리에서 꺼낸 것은 공구 상자와 크지 않은 장비 몇 개뿐이었다. 의도가 짐작되지 않는 조합들. 시더는 공구로 장비들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지?’
에스페란사는 피크닉 바구니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며 그 모습을 구경했다. 시더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샌드위치로 볼을 채우고 있는 에스페란사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당신도 먹을래요?”
“이거 하고 나서요.”
그 대꾸를 끝으로 그는 장비를 만지는 데 집중했다. 톱니바퀴와 태엽, 가늘고 작은 파이프들이 떨어져 나왔다. 시더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기초적인 공구만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했다. 머릿속에 설계도를 가진 것처럼 거침없었다.
돗자리 하나 크기의 협소한 공간에서 비가 들지 않는 중앙에 모여 앉아 있으니 젖은 팔이 닿아 몸이 오르내릴 때마다 스쳤다. 체온이 떨어졌으니 닿은 부분이 차가워야 하는데 천 두 겹을 사이에 둔 살갗의 온도는 이상하게도 뜨거웠다.
금빛 속눈썹에 맺힌, 미처 닦아 내지 못한 물방울이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물방울처럼 처연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가릴 텐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지 열중한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왠지 눈을 뗄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가진 섬세한 미모와 극도로 차분한 공기. 이지적인 금빛 머리칼을 타고 흐르는 듯한 조용한 우수. 황동빛 톱니바퀴를 조립하는 손짓에는 평소와 같은 즐거움도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 겹 벗겨진 내면을 엿보는 기분.
에스페란사는 무릎을 안은 팔을 당기며 생각했다. 시더의 내면은 아주 고요하다.
빗줄기는 장막이 되어 이 작은 공간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왠지 눈을 뗄 수 없었다.
“다 됐어요.”
잠시 후 시더가 기계를 내려놓았다. 에스페란사도 잠에서 깨듯 감상에서 벗어났다.
“……뭐예요, 그게?”
긴 손가락이 기계를 다시 들어 태엽을 감았다.
“마력이 부족해서 태엽이 필요하더라고요. 별 건 아니고, 시찰용 오토마톤이에요. 급하게 만든 거라 깔끔하진 않지만.”
몸의 골격 대신 톱니바퀴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으나, 어렵지 않게 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다. 조금 찌그러진 모양의 강아지였다.
“저기, 당신 지금 한 10분 걸렸어요. 저런 걸 그냥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마도 공학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안 되죠.”
에스페란사가 느꼈던 그 모든 감상들이 무색하게 원래대로 돌아온 시더가 숨 쉬듯이 오만한 소리를 뱉어 냈다.
“당신은 되고요?”
“보시다시피?”
태엽을 다 감은 시더가 강아지를, 아니, 오토마톤을 내려놓자 그것이 놀랍게도 아장아장 걸어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갔다.
“부품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약물 처리가 돼 있어서 잠깐 정도론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나인 호더로 돌아가면 전부 교체할 거지만.”
내일이면 한 줌의 톱니바퀴로 화할 예정인 강아지 오토마톤은 씩씩하게 걸어 수풀 사이로 사라졌다.
“귀여운데, 좀 아쉽네요.”
“가질래요?”
“나 줘도 돼요?”
“어차피 쓸 데도 없어요. 집 안에서만 갖고 놀겠다고 약속하면 가져도 돼요.”
7세 미만 아동이나 들을 법한 주의사항이다. 에스페란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왜 집 안에서만이에요?”
“너무 효율적이니까요. 저런 걸 만들 수 있다면 더한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군사용 시찰 도구 같은 것 말이에요.”
시찰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에스페란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다.
“이해했어요. 집에서만 가지고 놀죠, 뭐.”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면 안 돼요.”
시더가 실없이 말했다. 어린애 취급에 재미를 들린 모양이다. 에스페란사는 말없이 그의 입에 샌드위치를 물려주었다. 시더는 숨은 뜻을 알아듣고 얌전히 입을 벌렸다. 인벤토리에서 꺼낼 때까지만 해도 제법 따뜻하던 샌드위치는 추운 데 잠깐 있었다고 식어 버렸지만, 먹을 만은 했다.
그러고 보니 손이 빠르던데. 에스페란사는 덜 마른 손수건으로 손끝을 닦는 시더를 보며 생각했다. 머리도 좋고.
“혹시 큐브 할 줄 알아요?”
“큐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