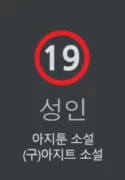I am a writer! RAW novel - Chapter 77
나는 작가다 077화
77화
“작가님, 혹시 도박 좋아하십니까?”
얼추 안지훈과의 미팅을 이루면서 판타지스타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정리한 이후 이탈리아 일정이 며칠 남은 찰나, 김 변호사가 갑자기 내게 조심스레 던진 질문이다.
뜬금없이 도박이라니.
하기야 당연히 나올 법한 주제이긴 했다.
해외 여행을 가면 보통 관광, 쇼핑 그리고 도박이었으니까.
도박을 좋아하냐는 김 변호사의 물음에 반문했다.
“카지노라도 가게요?”
하지만 단순 카지노를 갈 생각이 아니었나 보다.
고개를 가로젓는 김 변호사.
“그런 곳이 아니라 블랙마켓을 가볼까 하는데, 작가님께서 도박을 좋아하신다면 같이 가려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정에 가이드 역할로 함께하는 조항이 있었으니 허락은 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블랙마켓이요? 그건 뭐 암거래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흔히 장물 파는 암시장 같은 걸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로 그냥 불법적인 거래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보는 게 맞죠. 최소 억 단위로 돈 굴리는 사람들끼리 도박도 하는데, 그 정돈 돈은 충분히 있으시다고 들어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불법이긴 하나 각국의 정부 관료들이 전부 회원이라 걸릴 위험이 없는 곳이거든요.”
최소 억 단위라니.
K E&M에 묶인 돈과 K북스로 빼돌린 돈을 합쳐도 돈으로만 치면 5억도 안 됐지만, 어쨌거나 억 단위로 돈을 갖고 있긴 했다.
실질적으로 빠르게 다룰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2억 정도였지만.
어쨌거나 블랙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난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런 곳을 김 변호사님도 다니십니까?”
방금 김 변호사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각국의 정보 관료들이 회원이라고.
게다가 억 단위로 오고 간다는 걸로 보건대 평범한 정부 인사들은 아닐 터.
김 변호사가 꽤나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광해가 우리나라 로펌 중 세 손가락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기업이나 정부 인사들과 손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블랙마켓에 일정 수익 이상 변호사들은 출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익 이상 변호사들이면 몇 명 정도 되죠?”
“고위 간부 급 선배님들을 제외한 일반 변호사 중에선 저 포함 열 명도 채 안 됩니다.”
“이야, 김 변호사님이 꽤 능력자셨네요?”
“흐흐, 제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 꽤 친해져서 종종 이렇게 김 변호사가 능글맞게 굴었다.
하긴 그리 친해졌으니 방금과 같은 이야기도 할 터. 물론, 내가 부대표님과 친분이 있단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긴 했을 거다.
“근데 보통 그런 곳은 회원제로 돌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의 가입 역시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오, 절 추천해 주시려고요?”
“만약에 이준경 작가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요.”
“뭐, 가입하면 매 해마다 몇 억씩 써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형식상 일 년에 연회비로 천만 원씩 냅니다.”
“연회비로 천만 원씩이라…….”
지금 내 사정에선 그리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곳이니 가보고 싶단 마음이 생겼다.
나중에 작품에 써먹을 수도 있었고 말이다.
어차피 이탈리아에 머물 날짜도 좀 남았으니 그런 곳을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가보고 싶네요.”
“그럼 같이 가시죠.”
“예, 일단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하긴 반바지에 슬리퍼는 아니긴 하죠.”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나올 땐 귀찮아서 편한 복장으로 나왔다. 샤워도 하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조식을 먹고 적당히 소화한 후 헬스를 한 다음에야 씻었으니까.
한데 억 단위의 자금을 우습게 쓰는 사람들이 간다는 곳에 이런 복장은 아니다.
“흠, 오늘 운동은 걸러야 하네.”
“예? 아닙니다. 그냥 평소 하시던 거 하시고 저랑 저녁 6시쯤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아, 하긴 아침부터 갈 만한 곳은 아니죠?”
“아마 밤새 도박을 즐긴 회원들이 있어서 열려 있긴 하겠지만, 좀 다채롭게 구경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녁 시간대가 좋죠.”
“그럼 오후 6시에 뵙죠.”
“예, 제가 시간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와 저녁 약속을 잡은 뒤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작업에 집중했다.
작업을 쭉 하고 나니 어느덧 김 변호사와 약속 시간이 다가왔나 보다.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또로롱.
“예, 김 변호사님.”
“1층으로 내려오시죠.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자 김 변호사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이준경 작가님, 여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검은색 리무진 옆에 서 있었다.
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리무진.
그쪽으로 다가가 물었다.
“둘이 가는데 뭐 이리 긴 차량을 불렀습니까?”
“둘만 타는 건 아니니까요.”
“음?”
“타보시면 압니다.”
내게 그리 말한 김 변호사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문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했다.
“이렇게 둘이 동행입니다.”
“예.”
대기하던 사내가 문을 열어줬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내게 문을 가리켰다.
“타시죠.”
“알겠습니다.”
리무진 안에 탔다.
겉으로 본 것만큼이나 널찍한 내부.
그곳엔 이미 몇몇 사내들이 아가씨를 낀 채 앉고 있었다.
다들 날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창한 영어들을 쓰며.
“뭐야, 누구지?”
“나도 처음 보는데?”
“이봐, 자네 누군가?”
영어를 그리 잘 알아듣진 못했지만, 단어 하나가 그들이 내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걸 알려줬다.
바로 ‘Who’였다.
누구인지 물을 때 쓰는 단어.
하지만 내가 굳이 그들에게 소개할 일은 없어 보였다.
애당초 초면인 데다가 괜히 써봐야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대답이 전부였을 테니까.
‘My name is Junkyung Lee’ 같은.
애당초 무의미한 대답이다.
그들이 묻는 정체는 이름 같은 게 아니다.
뭐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할 터.
대답을 않자 다들 잠시간 침묵했는데, 뒤이어 들어온 김 변호사를 보곤 반겼다.
“오, 미스터 킴!”
“빈!”
“수빈!”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반겼다. 모두 김 변호사의 본명이 ‘김수빈’에서 딴 호칭이었지만 말이다.
내가 들어왔을 때와 다르게 꽤나 반기며 그들이 대화를 나눴다.
“뭐야, 미스터 킴 친구야?”
“친구는 아니고 고객입니다.”
“뭐? 고객을 뭐하러 데려온 거야?”
“그래도 한국에서 프리랜서로는 꽤 잘나갑니다.”
“프리랜서?”
“예.”
“뭐, 펀드매니저나 미스터 킴과 같은 변호사인가?”
“아뇨, 작가입니다.”
“작가?”
“예, 이름은 준경 리이고 판타지 소설 작가입니다.”
방금 김 변호사의 대답을 듣곤 생각했다.
내 소개를 하고 있구나.
그리 소개하자 나이 좀 있던 사내가 물었다.
“뭐, 마법학교와 전설의 돌과 같은 작품이라도 썼나?”
“짓궂네요, 해리 씨. 그건 지금 판타지 소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 소설 아닙니까?”
못 말린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김 변호사.
거기에 방금 말했던 사내가 음흉하게 웃었다.
“아니, 우리와 같은 블랙마켓 고객이 되려면 그 정돈 해야지?”
“그 정도면 저도 못 끼죠.”
“그래도 미스터 킴도 매 해 100만 달러는 넘게 벌잖는가?”
“일 년으로 치면 리 작가님도 100만 달러는 가뿐히 법니다.”
방금 김 변호사의 대답에 화들짝 놀라는 사내들.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듣기론 한국 작가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배를 굶주린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예, 그렇긴 한데 이준경 작가님은 매달 20만 달러씩 번다더군요.”
“호, 그 정도라면 낄 만하지.”
“그렇죠?”
꽤나 다들 감탄하고, 흡족해 마지않는 김 변호사.
대관절 무슨 대화를 나눈 건가 싶었다.
“뭐라는 겁니까?”
“작가님더러 마법학교와 전설의 돌 정돈 쓰냐고 묻더군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마법학교 시리즈.
그 정도 급을 바란다니.
아직 나로선 비비지 못할 위치였다.
만약 그만큼 팔았다고 어땠을까?
난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걸 썼으면 전 여기를 김 변호사님과 온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휴양을 보내고 있겠지요.”
내 대답이 궁금한지 백인 사내가 물었다.
“뭐라는가, 작가 친구께선?”
“만약 자신이 마법학교와 전설의 돌만큼 썼으면 이탈리아에 이렇게 일하러 온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휴양이나 보냈을 거랍니다.”
“허허, 하와이에서의 휴양이라. 뭐, 안 해본 사람들에겐 로망과도 같은 거긴 하지. 그래도 두세 번 가면 금방 질린단 말이지. 차라리 여기서 미스터 킴의 소개로 블랙마켓을 알게 된 걸 좋게 생각하라고 하게. 그보다 재밌는 휴양은 따로 없으니까 말이야.”
“따면 말이죠.”
지금 나눈 대화 역시 김 변호사가 알려줬다.
도박이란 따게 되면 어느 것보다도 즐거운 오락이 됐지만, 잃는 사람에겐 그 어떤 것보다도 지옥과도 같은 종목이었다.
반면 백인 사내는 자신에겐 어느 쪽이 되어도 오락이란 걸 밝혔다.
“난 잃어도 즐거운데?”
“제가 일 년 동안 빡세게 일한 돈을 하루에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루라니. 그건 좀 칭찬이 과하군, 미스터 킴. 이틀 정도면 모를까?”
“……그거나 그거나요.”
김 변호사의 대답을 백인 사내가 다시 날 턱짓으로 가리켰다.
“어쨌거나 저 친구는 뭐하러 가는 건가? 경매? 도박? 유흥?”
“뭘 좋아할지 모르니 가서 소개 좀 시켜주고 골라잡으라고 시켜야죠.”
“경매라면 손을 떼라고 하게나. 오늘 내 주종이 경매거든.”
그 말 역시 김 변호사가 전했다.
“보통 블랙마켓에 가면 경매, 도박, 유흥 등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분이 경매는 포기하라고 하시는군요. 자기 오늘 주종이니.”
“어차피 돈이 많은 분들일 테니 제가 경매에 낀다고 이길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저분들을 돈으로 짓누르려면 이길 수 있는 건 도박밖에 없죠. 아니, 솔직히 도박도 힘듭니다. 워낙 운이 좋은 양반들이다 보니까요. 그나마 스포츠 도박 쪽으로 본인들 손이 안 타는 건 확률이 좀 있지만, 승부 조작으로 도박판을 뒤엎는 것도 가능한 사람들인지라…….”
“승부 조작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애당초 블랙마켓 자체가 불법인걸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저분들에겐 스포츠 도박을 위한 승부 조작 역시 본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과시하기 좋은 도구일 뿐이죠.”
승부 조작으로 도박에 이기는 것마저 자신들의 재산으로 운을 좌지우지한다는 건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이준경 작가님이나 제가 일 년 동안 버는 돈 며칠 만에 벌고 그러는 분들이니까요.”
“……엄청나군요.”
솔직히 놀랐다.
나나 김 변호사가 버는 돈이 몇 억도 아니고 10억이 넘었다.
그걸 며칠 사이에 번다?
일 년에 몇천 억의 돈을 주무른다는 소리였다.
대관절 무슨 일을 해야 그런 게 가능할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 사내의 정체부터 물어봤다.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이분요?”
“예.”
김 변호사는 백인 사내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내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혹시 칠리아노 마피아라고 아십니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