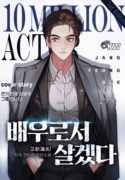Maya RAW novel - Chapter 296
296
후개의 무공은 광화자나 옹홀개보다도 못했다. 개방 제일의 기재라고 인정되어 용두방주의 눈도장을 받은 사람이 옥룡장법조차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다.
용두방주가 이 지경이니 무공 지도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으랴.
“휴우!”
용두방주가 간신히 기침을 진정시키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옥룡장법은 흉내만 낸 것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쯧!”
“…….”
마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두방주의 말이 맞다. 초식만 차용해 왔을 뿐, 안에 담긴 무리(武理)는 콘에게서 얻은 석상무공이었다.
굳이 석상무공이라고 단언할 필요도 없고, 무리까지 꺼내 들지 않아도 된다.
마야의 몸놀림은 최상의 상태로 고정되었다. 손을 뻗는 것, 발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까지 철저한 싸움꾼이 되었다.
콘이 그렇게 만들어주었다. 석상무공은 무공을 준 게 아니다. 싸움꾼을 만들어주었다.
빠른 게 능사가 아니다. 강한 게 최고가 아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제일이 될 수는 없다.
초식에 연연할 필요가 무엇이랴. 초식이란 몸을 단련하고 감각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단련된 몸과 강인한 내력과 뛰어난 반사 신경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어야 하며, 절정 초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가? 당연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석상무공은 멸신구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만들기 힘든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무인이 추구하는 바를 마야가 이뤄낸 것이다.
“날 만나고자 왔을 텐데, 이런 몸이라서 안됐네.”
“방주의 마음만 얻으면 되잖겠습니까.”
“마음을 얻는다. 쿨룩! 쿨룩!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하지 않다. 용두방주를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았다. 정도 무인이라는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사람이다. 혀를 깨물고 죽을 수는 있지만 마인과 손을 잡지는 않을 사람이다.
양리리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하나 마야가 살짝 손짓을 해서 말을 막았다.
양리리와 다담선자는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용두방주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후개 또한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 여인은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과감한 거래 조건을 만들었다.
분명히 개방 안에 무슨 일이 있다. 용두방주의 신상에 변고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용두방주가 사망할 경우, 혹은 후개에게 방주 직을 물려줄 경우 후개는 방주만이 수련하는 타구봉법(打狗棒法)을 연성해 내야 한다.
두 여인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후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한 소양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면에 나설 만한 무공이 아닌 것이다.
후개에게 개방 무공을 완벽히 연성시켜 줄 수 있다면 개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여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중원 천지에 사람은 많지만 이런 일을 가능케 해줄 사람은 일견후즉파인 마야뿐이니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잘못 생각한 게다. 마인에게 지도를 받느니, 차라리 후개를 폐하는 쪽을 선택하리라.
양리리와 다담선자의 생각은 쓸모없었다. 그런 목적 때문이라면 개방에 올 필요도 없었다.
용두방주를 흔들 필요가 있다.
마야는 마음속 말을 숨겼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이만 돌아가 볼까 합니다.”
용두방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심하게 대할 걸세. 자넬 곤란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군.”
대타구진을 뚫고 나가란 소리다.
“희생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두방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후후후! 자넨 개방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봤나? 수천? 수만? 수십만이네. 말 그대로 수를 헤아릴 수 없지. 밖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만 저들을 다 죽인다 해도 새 발의 피란 이야기네. 그리고 이후부터 자넨 수십만의 적이 되는 게지.”
예상했던 말이다. 용두방주에게서 개방에 대한 자부심을 빼면 무엇이 남으랴. 당연한 말이 나왔다. 그리고 용두방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만, 이 말은 마야가 기다리던 말이기도 했다.
“후후! 이후부터가 아니죠. 이전에도 적이었습니다. 하나, 개방은 제 앞을 막지 못하더군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막겠지. 쿨룩! 쿨룩!”
“이번에는 제가 말해야겠군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주, 방주는 아실 겁니다. 방주께서 주화입마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일장 다툼부터 일었을 것이고, 그러면 방주는 제게 죽었을 겁니다. 흉내라고 했습니까? 그 흉내, 타구봉법도 할 수 있습니다.”
용두방주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그는 도발적인 마야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듯 따스함까지 풍겼다.
“그런가. 피곤하군. 그만 가보게. 한 세상, 잘 살다 가시게나.”
반벽전절도인봉전(絆劈纏截挑引封轉).
타구봉법 팔자결(八字訣)이다. 삼십육로(三十六路) 타구봉법을 이어가는 근간이다. 팔자결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고, 삼십육로 속에 녹였느냐에 따라서 초초위력경인(招招威力驚人)이라는 타구봉법의 진가가 결정된다.
봉타쌍견(棒打雙犬)! 이신맹지세횡소적쌍족(以迅猛之勢橫掃敵雙足)!
쒜에엑! 따악!
사나운 경풍이 불었다.
타구봉이 땅을 쓰는 듯 휩쓸어가더니 개방도의 두 발을 맹렬히 가격했다.
봉타구두(棒打狗頭)! 이신맹지세향적두정격거(以迅猛之勢向敵頭頂擊去)!
쉬익! 퍼억!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다시 땅으로!
솔개처럼 내리꽂힌 타구봉이 누군가의 정수리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가격했다.
개방도가 힘없이 쓰러진다. 터진 머리에서 누런 뇌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즉사다.
땅에 내려온 마야의 신형이 비틀거렸다. 발을 헛디뎠을 때처럼.
마야 같은 고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 실수이고, 개방도에게는 천고에 다시없는 기회다.
쒜에엑!
여지없이 타구봉이 날아들었다. 사방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짓쳐들었다. 그때!
“안 돼!”
누군가 거센 고함을 토해냈다. 하나 늦었다.
발구조천(撥狗朝天)! 봉신신출(棒身伸出)! 장적병기전단도솔상래(將敵兵器前端挑 上來)!
타구봉이 휘어져 올라가며 개를 길들인다.
따아악! 따악! 따아악!
타격음이 모골을 송연케 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가격 한 번이면 족하다. 두 번의 손질도 필요없다.
“엉엉! 엉엉엉!”
“아이고! 엉엉! 아이고!”
개방도의 곡성도 하늘을 찔렀다. 무려 천여 명이 일시에 토해낸 울음소리다.
울음바다 한가운데 마야가 있다.
정신이 어지럽다. 두 귀를 틀어막고 싶다. 울음소리가 지겹다 못해 소름까지 끼친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정작 무서운 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일경발동(一經發動:경력이 발출되면),수시재변환진법(隨時在變換陣法:진법이 수시로 변환한다),설시지나시쾌(說時遲那時快:얼마나 빠른지 말하는 것보다 빠르다).
타구진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쒜엑! 쒜에엑!
타구봉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온다. 한 사람이 펼친 봉법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데, 타구진으로 진형을 갖추어 쏟아내니 속도가 세 배, 네 배는 빨라진 것 같다.
반절구둔(反截狗臀)! 봉신횡소적둔부(棒身橫掃敵臀部)!
타구봉을 가로로 쓸어서 개의 볼기를 두들긴다.
쒜에엑!
타구봉이 타구봉을 맞아갔다.
무림사에 두 번 다시 구경할 수 없는 진기한 풍경이다. 개방이 자랑하는 두 절학, 천여 명이 펼치는 대타구진과 방주만이 수련할 수 있는 타구봉법이 맞붙은 한 판이다.
“후욱! 후우욱!”
마야는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적멸주, 마령음, 환희마소…….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비기를 버리고 오로지 개방의 무공으로만 개방도를 상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용두방주의 말이 맞았다.
개방도는 인원이 많다. 끝없이 밀고 들어오는 인해전술(人海戰術)에는 지칠 수밖에 없다. 천만다행인 것은 영매술이 끊임없이 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여 손상된 진기를 보충해 준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탈진했을 게다.
개걸산은 아비규환이었다.
피가 강이 되어 흐르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신음 소리가 곡성을 압도했다.
사술을 쓴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한 결과다.
“괴물이군.”
누군가가 말했다.
하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백 명이 쓰러지면 이백 명이 채워졌고, 이백 명이 쓰러지면 사백 명이 모여들었다.
개걸산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개봉부 전체를 뒤덮었고, 개봉부 안에 있던 걸개들은 손에 손에 타구봉을 부여잡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쓰러진 숫자는 많다. 하나 서 있는 걸개가 더 많다. 또한 개걸산에 있는 걸개보다 달려오고 있는 걸개가 훨씬 많다.
개봉부가 무너지면 하남성, 하남성이 무너지면 중원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개방도가 달려들 판이다.
그들은 마야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2
“봤느냐?”
“봤습니다.”
“어떠냐?”
“놀랍습니다.”
“저건 네 것이다.”
“제 것입니다.”
“네 것을 남이 가져갔다. 어찌하겠느냐?”
“반드시 목숨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타구봉법은 철저한 비인부전(非人不傳), 일인전승(一人傳承). 제삼자가 안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오늘 처리할 수 있겠느냐?”
“…….”
“서두를 건 없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모레도 안 되면 글피에 처리하면 된다. 받아라.”
용두방주는 비급 한 권을 내밀었다.
“이 자리에서 도해(圖解)와 구결을 완전히 숙지한 후, 태워라.”
“넷!”
후개 담뢰는 비급을 받아 든 후 급히 책장을 넘겼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무인이라면 누구나 훑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타구봉법이 아닌가. 소림에 칠십이종(七十二種) 절예(絶藝)가 있다지만 능히 타구봉법으로 상대할 수 있다.
천고의 절예가 손에 들렸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 천천히, 천천히.”
“네.”
담뢰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흥분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것만 익히면…….’
담뢰는 비급에 몰두했다.
“아아악!”
관제묘 밖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 담뢰의 모든 신경은 비급에 쏟아 부어졌다.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많다. 무공에도 문일지십의 기재가 있다. 공자(孔子), 맹자(孟子)를 논할 때는 하품만 찍찍 해대다가도 무공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있다.
담뢰는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저놈이 이 아이에게 기연을 안겨주었어. 타구봉법을 전수할 길이 막막했는데.”
용두방주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깔렸다.
모든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게 돌아갔을 때 곧잘 흘리곤 했던 웃음이다.
그의 앞에는 다섯 명의 노개가 앉아 있었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사람이 둘이다. 광화자와 옹홀개. 개방 제삼장로와 제육장로다. 용두방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셋이다. 제일장로인 취옹개(醉翁 ), 제이장로 팔비개(八鼻 ), 제사장로 죽적개(竹笛 )다.
밖에서 대타구진을 지휘하고 있는 사천왕까지 합하면 무려 아홉 명의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개방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장로가 모인 적은 없었다. 있다면 오직 한 번, 후개가 개방 방주로 취임할 때뿐이다.
더욱이 지금은 절대 모여서는 안 될 상황이다.
후개가 타구봉법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순간이지 않은가.
비인부전, 일인전승.
방주 이외에는 전승되어서는 안 되는 비기가 있는 곳이니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방 장로라 할지라도.
용두방주가 직접 부르지 않았다면 취옹개라 할지라도 개방 율법에 따라 두 눈이 파이고 말았으리라.
“타구봉법이 아주 절묘합니다.”
취옹개가 말했다.
“어디서 배웠을까?”
용두방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두 초식이면 모르겠는데 삼십육로 모두 정확해. 정확한 게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몸에 붙어 있어. 십 년, 이십 년 타구봉법만 수련한 사람처럼.”
“마군이…… 사람 보는 안목은 뛰어났죠.”
결국 담뢰가 문일지십이라면 마야는 문일지천(聞一知千) 정도 된다는 소리다.
개방은 반딧불을 주웠는데, 마군은 태양을 건졌다.
아깝지만 아쉬울 건 없다. 태양은 흔한 게 아니니까. 중원을 샅샅이 뒤져도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리고 태양을 없애고 나면 세상은 다시 반딧불들의 세계로 돌아갈 테니까.
“내가 타구봉법을 완전히 펼쳐 보인 적은 수련할 때 외에는 없네. 폐관묘(閉關墓)에 드나들 수 있는 자 중에 간자(間者)가 있을 게야. 색출해 내게.”
“간자가 수련하는 무공을 보고 타구봉법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흘러나갈 길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