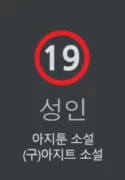Surviving as a Writer in the British Empire RAW novel - Chapter (57)
“아 참. 내가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군.”
“예?”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지? 설마 밀입국자라고 쫓아내려는 건 아니겠지?
왕족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놀란 내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사이, 왕세손은 품에서 매우 익숙한 무언가······ 그러니까 [피터 페리> 제1권, 요정의 숲 편을 내밀며 말했다.
“사인(autograph) 좀 해 주시오.”
“······그, 예?”
“사인 말이오. 대충 조지, 메리, 그리고 에드먼드에게라고 적어 줬으면 좋겠군.”
“아, 알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안쪽에 천천히 원하시는 대로 무아몽중으로 흘겨 적었다. 그런데 어라, 쓰고 보니까 이거, 영어가 아니다?
나는 왕세손 각하의 눈에서 당당히 비치는, 위대한 세종대왕님의 산물······ 그러니까 한글을 보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건 무슨 글자요?”
“아, 그,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온 한국,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자입니다. 원하시면 다시 써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소. 이건 이거대로 희귀하겠군.”
만족스럽다는 듯, 왕세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 진짜로? 그래도 돼요?
“그보다, 조선이라······ 어렴풋하게 들은 기억이 있소. 이래 봬도 일본에도 가 본 적이 있거든. 거기서 팔에 드래곤 문신을 새기고 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싶소?”
“아, 아뇨! 됐습니다.”
그런가? 라며 조지 왕세손은 무척 아쉽다는 듯 곧 걷어붙이려던 팔을 내렸다.
뭐야, 이 사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대영 제국의 왕세손이 맞나? 그냥 철없는 한량이 아니고?
얼떨떨한 눈으로 조지 왕세손을 보자, 왕세손은 쓰게 웃으면서 고개를 젓고 말했다.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아 주시오. 이, 요크 공작이란 지위가 매우 불편한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아, 예에.”
“아마 그대도 알진 모르겠소만, 난 왕세손이 될 팔자가 아니었소. 그건 죽은 형의 몫이었지. 지금은 내 아내가 된 메리까지도.”
나는 예전, 밀러 씨에게 들은 얘기를 얼핏 떠올렸다.
원래 왕세손이 갑자기 결혼식을 앞두고 급사하는 바람에 동생이 이어받았다는.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단순히 왕족들이다 보니 형사취수제도 남아 있구나~ 정도의 감상이었는데, 막상 그 본인이 눈앞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니 참으로 괴상한 기분이다.
“예정에 없던 정략혼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렇기에 메리에게 더욱 잘해 주고 싶소.”
“으음. 무척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조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런 메리가 가장 좋아하고, 미소를 보여주는 게 당신 뿐이니, 남편으로서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아니 그걸 제가 뭘 어쩌라고요.
“크흠. 저기, 전 그냥 평범한 작가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뭐, 그대도 아마 나중에 결혼한다면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본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소. 일단 요즘은 에드먼드가 생겨서 비슷한 미소를 자주 보고 있소만.”
“그건······ 다행이군요. 근데, 에드먼드요?”
“원래는 에드워드(Edward)라 지을 생각이었소. 돌아가신 형님의 애칭인 에디(Eddy)에서 따올 거였거든. 그런데 [던브링어>를 보고 나니 기왕 지을 거, 에드먼드인 쪽이 나아 보여서 말이오.”
그러니까, 차차차기 국왕의 이름을 바꿨다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던브링어>를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인지 모르겠다.
혹시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거 아냐?
“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날 패닉 상태로 몰아가 놓고, 조지 왕세손은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뚝 잘라 멋들어지게 불을 붙였다.
이놈의 담배 냄새는 영국에서 몇 년을 지냈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는 구만······.
“나와 친구가 되어 줬으면 좋겠소.”
“······예?”
그때 갑자기 이 철없는 왕족이 핵폭탄을 던졌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대영 제국의 차차기 국왕께서 그냥 일개 소설가랑 친구?
아니, 뭐 그야 이 양반 부부가 내 팬이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말이지.
“각하. 죄송하지만 전 아까도 말했듯 한국, 아니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도 아니고, 딱히 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라뇨.”
“어차피 나도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소만.”
“아니, 거시기요.”
이렇게 잘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 확실히 왕의 재목은 맞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문제는 그 재능을 나한테 억지 쓰느라 쓰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답답해하자, 조지 왕세손은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아오. 할머님께서 그렇게 절대권력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나도 그저 그런 푸른 피로만 보이겠지.”
“아뇨, 그 뭐.”
“하지만 나로선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기만 하오. 그저 예전 해군 장교로 있던 때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거나, 우표를 수집하거나, 사냥도 하고 책을 읽거나 하면서 말이지.”
“으음······ 그래도 왕손이면,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조선은 그런가 보오?”
글······ 쎄요? 내가 거기서 오긴 했는데 조선 왕실 생활까진 우예 알겠슴까. 그냥 난 대한민국 서민이었는데.
피식피식 웃던 조지 왕세손은, 고개를 저으며 시가 연기를 푹 내뿜으며 말했다.
“최소한 나는 그런 교육 받은 적 없소. 그런데 뜬금없이 형이 죽고, 왕세손이 되더니 가정교사들이 뭐라는 줄 아시오? 단어 좀 틀린 거 갖고 꼽을 주질 않나, 지적 수준이 철도 짐꾼 수준이라질 않나······.”
“아, 하하. 하하하하.”
“이러니 내가 당신 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으, 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 글은 읽기 쉽다는 평이니 말이지.
뭐, 그냥 내 영어가 그렇게까지 고급이 아니라서 적당히 따라가는 거지만.
“그래도 친구라니, 솔직히 너무 과분한 말씀이라 좀. 얼떨떨하긴 합니다.”
“뭐, 정 부담되면 거절해도 상관없소. 이렇게 간간이 사인한 책이나 보내줘도 상관없고. 크게 사례하리다.”
“아뇨, 그럴 순 없죠.”
나는 단박에 말했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하는 건 당연히 예의가 아니죠. 잠시만요.”
나는 잠시 몸을 일으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밀러 씨가 애지중지하는 브랜드 위스키 컬렉션을 열었다.
밀러 씨가 알면 노발대발하겠지만, 상대가 왕세손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지.
어차피 내 사비로 채워 넣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제가 술은 즐기지 않지만, 이런 좋은 날이라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호오. 이거, 이렇게까지 배포가 클 줄은 몰랐군.”
“원래 제가 또, 이. 지를 땐 화끈하게 지르는 스타일입니다.”
주로 가챠 때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조지 왕세손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챠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한정 1티어급 인맥이 눈앞에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아, 이건 못 참지.
물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
권력이란 건 모름지기 태양과 같아서, 지나치게 가까이하면 타 버리는 거라지.
나야 그저 일개 소설가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친분을 유지하면서 가끔 좋은 거 얻어먹으면 그걸로 만족이지.
그래, 그냥 돈 많은 형님 생겼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
내가 뭐 엄청난 뭐시기라서 정경유착 같은 걸 할 것도 아니고,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다.
말을 하다 보니 이 눈앞의 왕세손 전하께서도 그런 불순한 것을 곧이곧대로 들어 줄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독한 위스키를 통해 서로 한 껍질, 한 껍질 벗기고 보니 조지 왕세손, 그리고 어쩌면 그 아버지인 에드워드 왕세자 또한 느끼고 있을 감정이 조금씩 드러났다.
바로 부담감.
너무 위대한 빅토리아 여왕,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후계자들의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확실히 나도 빅토리아 여왕만 알지, 그다음 왕들은 잘 모르지.
음, 근데 대체 얼마나 능력자길래 이렇게까지 부담을 갖는 걸까? 한번 보고 싶긴 하네.
“그래서 되도록, 나나 아바마마는 왕위를 잇더라도 최대한 골치 아픈 정무는 때려치울 생각이요. 다른 나라 왕들은 민주주의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솔직히 말해 난 그렇게 머리 빠지게 정치하고 살 생각 없소이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열심히 일해 봤자 누가 알아준다고요. 돈도 많겠다, 그냥 맘 편히 하고 싶은 거나 하며 사는 게 최고죠.”
“내 말이 그 말이요! 이제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군!”
좀 피곤해서 그런지, 그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평소보다 머리에 취기가 빨리 오르는 기분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리는 허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오. 대체 왜 거기서 피터를 죽인 게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울고불고했는지 아시오?”
“거참, 기시감 들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네. 그래야 예? 임-뽝토가 있다아입니까, 임뽝-토가!”
“해괴하기 그지없군. 그렇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니 기분이 좋소?”
“거야 물론이죠. 내가 이 사람을 화나게 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 이걸 말이죠, 한자로는 감동(感動), 그러니까 ‘감정을 움직였다.’라고 쓴단 말입니다.”
“허허, 퍽이나 감동적이구려(Sensational).”
내 글에 대한 거라든가.
“사실 말입니다, 저는 왕세손 각하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에 제 저작물을 쓰시면서 협찬비 하나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거참, 쩨쩨하기도 하군.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가 무료로 그대의 글을 홍보해 준 셈인데, 어찌 거기에 저작권료를 받아먹을 생각을 하오?”
“아, 그런 걸 하나하나 받아 주다 보면 2차 창작으로 이상한 놈들이 튀어나온다고요! 에로 동인지라든가!”
“그게 대체 뭔 소린가!?”
옛날 결혼식 얘기라든가.
“그러고 보니 자네, 글 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던데 혹시 뭔가 취미는 없는가?”
“글쎄요. 글 쓰는 거 자체가 취미이기도 하죠.”
“세상에. 다른 데에도 좀 취미를 들여보게. 사냥 어떤가? 응? 내가 이래 봬도 사냥총의 명수라네. 언제 한번 노퍽(이스트잉글랜드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카운티)에 오게. 와서 요크 별장(York villa)에 며칠 머물면서 사냥 승부나 하세나.”
“흐음. 감히 원딜의 민족 앞에서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좋죠! 제가 이래 봬도 군대 있을 때 만발, 그러니까 스무 발 쏘면 스무 발 전부 명중해 본 사람입니다!”
서로 집에 놀러 오라는 얘기라든가.
생각보다 진짜로, 차차기 국왕이 될 사람치고는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 바로 조지 왕세손이었다.
흠, 가만.
털털한 왕족,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털털한 왕족이라.
뭔가 기깔날 소재가 떠오를 거 같은데?
“왕세손 각하.”
“으으응?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말입니다.”
“어어.”
“다른 방법으로 갚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응? 무엇으로.”
그러니까.
“혹시, 소설에 등장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몸으로 갚으시라고요.
[ 이 프로그램은 보고 계신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6) > 끝오